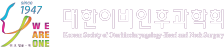나를 괴롭히는 꽃, 꽃가루 알레르기 도감
 0
나를 괴롭히는 꽃, 꽃가루 알레르기 도감 저자
0
나를 괴롭히는 꽃, 꽃가루 알레르기 도감 저자
정이비인후과 서정혁 원장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
필자는 20여 년 전 대전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비염환자들에게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여 왔는데, 꽃가루 항원 중에 잘 모르는 식물이 참 많았다. 식물공부를 하고 나서야 익숙해진 자작나무, 오리나무,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느릅나무, 딱총나무, 피나무 등 이러한 꽃가루 항원들의 이름을 접할 때마다 어떤 식물인지 항상 궁금해하면서도 실제로는 본 기억도 없는 것 같고, 잘 알지를 못하니,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 결과를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널리 알려진 대로 수목화분, 목초화분, 잡초화분이라고 두루뭉술한 설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식물들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였다.
궁금하였지만 이러한 식물에 대하여 특별히 어디 가서 쉽게 배울 수 있는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였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고등학교 동창들의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진을 찍게 되었다. 사진배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기초적인 카메라 조작법을 익히고 처음에는 이것저것 사진을 찍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아파트 화단에 있는 꽃에 눈길이 갔는데 매년 흔히 보는 꽃임에도 그 이름을 몰랐다. 그때 뭔가 정수리를 얻어맞은 느낌으로, 더 늦기 전에 주변에서 흔히 보는 식물 100여 종이라도 알고 세상을 살아가자는 결심을 하고 우선 근처 수목원부터 찾아갔다.
몇 년 동안 식물공부를 하면서 찍어 둔 사진이 10만 장, 20만 장 그 이상 쌓이다 보니 그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어 또다른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이비인후과 전공 분야와 관련이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꽃가루 알레르기 관련 도감을 쓰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꽃가루 알레르기 도감을 쓰면서 알게 된 일들
처음에 알레르기 도감을 쓰기 시작하였을 때는 책 내용이 이렇게 많아질 줄 생각도 못하였다. 오히려 그동안 사진을 찍어 놓은 몇몇 종류의 식물사진만으로 책을 낼 수 있을까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데 관련자료를 찾아보고 그동안 알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책 내용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자료는 내가 진료하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비염환자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 결과를 통계분석한 자료였는데, 일부(2008년도) 검사결과를 통계분석 해 보니 너도밤나무의 양성률이 참나무에 버금가게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너도밤나무는 울릉도에만 자생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대전지역에서 이렇게 알레르기 양성률이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의문이 생겼다. 결국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본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은 3,423명의 환자에 관한 자료를 통계분석 하였는데, 너도밤나무는 항상 참나무와 비슷한 높은 양성률을 보였다.
그리하여 항원들 간의 교차반응을 의심하고 보다 심도 깊은 통계분석을 하여 알레르기 양성률뿐만 아니라, 항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그 연구결과를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피부단자검사에서 통계학적 분석을 통한 교차반응에 대한 연구> 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그 결과 이 책에는 식물의 계통분류에서 가까이 연관된 식물가족들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식물들이 함께 포함되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는 더 찾아서 포함시켜야 할 항목들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그동안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대체로 수목화분, 목초화분, 잡초화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필자는 알레르기 도감 책 편집이 끝나갈 무렵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가 감수를 의뢰하였는데 그 자리에 모인 연구원들의 첫 마디가 이러한 분류방식은 식물학에서 분류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수목화분, 목초화분, 잡초화분으로 구분하는 것은 식물의 분류체계와는 상관없이 병원에서 편의상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필자가 관찰한 개화시기
수목화분>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꽃가루 항원에 대하여 필자가 관찰한 개화시기를 봄부터 살펴보면 서울, 대전 등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자작나무과(Betulaceae)에 속하는 오리나무(alder), 개암나무(hazel)는 3월초가 되면 벌써 꽃이 피기 시작하여 꽃가루를 날리고 4월초가 되면 거의 꽃이 진다. 자작나무속(birch) 나무들은 대체로 오리나무, 개암나무보다 2~3주 늦은 3월 중순부터 4월에 꽃이 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버드나무(willow)와 포플러(poplar) 수종들도 비교적 일찍 개화하기 시작하여 3월 중순부터 도심 하천과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산림의 4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참나무(oak) 수종들은 4월 중순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하여 주변의 산들이 연녹색으로 물드는 것을 볼 수 있다. 4월이 되면 참나무뿐만 아니라 양버즘나무(plane tree), 느릅나무(elm), 단풍나무(maple), 딱총나무(elder), 물푸레나무(ash), 은행나무(ginkgo), 느티나무, 팽나무, 뽕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등이 줄줄이 앞 다투어 꽃이 피기 시작한다. 5월로 넘어가면서 소나무(pine), 전나무 등과 아까시나무(black locust) 꽃이 피는데, 5월에는 소나무에서 날리는 화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피나무(liden)와 밤나무는 대체로 6월이 되어야 꽃이 핀다.
그러나 이러한 개화시기는 지역에 따라 도심주변 혹은 산간지역에 따라 2~3주 정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필자가 직접 관찰한 개화시기와 다른 자료를 비교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던 것 중 하나는 다른 자료에 나온 대부분의 개화시기는 필자가 관찰한 것보다 약 1개월 가량 늦게 기록된 경우를 종종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개화시기가 점점 일러진 것인지, 아니면 필자가 주로 도심 주변에서 관찰한 것이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꽃피는 시기를 주변에서 관찰하여 알려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물)오리나무 꽃, 촬영 3월11일
오리나무는 전국에 널리 분포하며 이른 봄인 3월에 꽃이 핀다. -

오리새 꽃, 촬영 5월31일
오리새는 전국에 고루 분포하며 5~6월 초여름에 꽃이 핀다. -

창질경이 꽃, 촬영 5월3일 서울 한강변
창질경이는 유럽원산 귀화식물로 전국의 해안가, 길가 풀밭 등에 드문드문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돼지풀 꽃, 촬영 9월16일
돼지풀은 북미원산으로 전국에 널리 분포하며 9-10월에 꽃가루 알레르기 영향이 높다.
목초화분>
목초화분으로 검사하는 대부분의 항원들은 벼과(Poaceae)에 속하는 식물로 오리새(orchard grass), 왕포아풀(Kentucky bluegrass), 호밀풀(reygrass), 넓은김의털(meadow fescue)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5~6월에 꽃이 핀다. 이외의 벼과 식물 중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잔디, 개밀, 갈풀 등은 5월부터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고 강아지풀, 수크령 등은 8~9월에, 식용으로 재배하는 벼는 모내기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7~8월경에 꽃이 핀다. 9~10월이 되면 갈대, 억새 등이 꽃이 핀 것을 주변 들판과 하천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들도 대표적인 벼과 식물에 속한다. 이렇게 벼과 식물들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긴 기간에 걸쳐서 꽃이 피어 꽃가루를 날리는데, 다만 병원에서 검사하는 알레르기 항원은 벼과 식물 중에서 외국에서 도입된 일부만 목초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대체로 5~6월에 꽃이 피는 항원들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느끼기에 벼과 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는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는 벼, 강아지풀, 갈대, 억새 등이 각각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잡초화분>
잡초화분으로 설명하는 식물들의 개화 시기는 민들레(dandelion)의 경우 지역에 따라 3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늦가을까지 피는 것이 관찰되었고, 소리쟁이(sorrel), (창)질경이(english plantain)도 5월이면 꽃이 피기 시작한다. 쑥(mugwort)과 비름(pigweed)은 한여름인 7월부터-9월, 명아주(Lamb’s quater), 환삼덩굴(japanese hop), 돼지풀(ragweed) 등은 8~10월에 주로 개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병원에서 잡초화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항원에는 국화과 식물이 많이 포함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민들레, 쑥, 돼지풀도 국화과에 속하며 그 외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망초, 개망초, 큰금계국, 기생초, 쑥부쟁이, 미국쑥부쟁이, 구절초, 산국, 감국, 엉겅퀴 등 수많은 식물이 국화과에 속한다. 그러므로 국화과 식물은 계절을 구분하여 개화시기를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알레르기 피부반응 검사를 해보면 몇 가지 종류의 항원에 대하여 동시에 양성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 항원에서 이러한 경우가 많다. 이들 중에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도 많지만 아주 드물게 분포하는 식물도 많다.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된 항원을 사용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식물분포와 잘 맞지 않는 항원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우 검사하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어떤 식물이 환자에게 보다 위험도가 높은 지 구분하여 설명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너무나도 익숙하여 습관화되어버린 꽃가루 알레르기 설명법인 봄철 수목화분, 여름철 목초화분, 가을철 잡초화분이라는 단순공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래야 오리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오리새, 왕포아풀, 우산잔디, 명아주, 돼지풀 등 각 식물에 관심이 가고 환자들에게 더 진지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